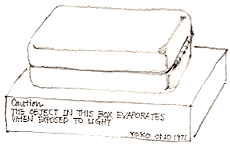오노 요코
2003 8. 14
오랫동안 벼르던 끝에, 드디어 오노 요코전을 봤다.
사실은 일주일 전 쯤 봤지만, 이렇게 써야 좀 극적인 인트로가 될거 같다고 사료되는바, 마치 방금전에 본 거 같이 얘기하기로 한다.
어쨌든, 나는 비틀즈에도 존 레논에도 그다지 관심이 없는고로, 오노 요코에도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물론, 그녀를 존 레논의 별책부록 쯤으로 여기는 이런 사고방식은 부당하기 그지도없고 부적절하기 짝도없는 얘기다만, 사실 존 레논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오노 요코라는 이름이 이 정도로 세계 방방곡곡에 알려지지는 않았을테니, 변명의 여지는...그래도 없나? 뭐, 그럼, 본인을 매우 치시라..
한번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게 된 오노 요코전은, 작가 이름만 가지고 개김으로써 제목만 뻑쩍지근하고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전시회들과 비교했을때, 무척이나 훌륭한 것이었다.
물론 그런거하구 비교 안해도 멋진 전시였고.
필자의 평소 정보 저장능력으로 미루어보아, 일주일이 지난 지금에도 꽤 많은 작품들이 기억에 남아있는 일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그건 작품 그 자체가 아닌, 그 작품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전해지는 오노 요코라는 사람의 매력 덕분이었다.
물론, 같이 소주 한 잔 해보거나 고도리 한 판 쪼여보지는 않아서 평소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는 모르겠다만, 적어도 그녀의 작품에서는 작위적인 아이디어나 치기어린 반발 또는 섣부른 과시 같은 것들이 뿜어내는 피곤한 소란스러움 같은것은 없었다.
뭐랄까,
그녀의 작품에서는 마치 따뜻한 봄날의 툇마루에 앉아서 천천히 자신의 앨범을 보여주는 친구의 손등에 비친 햇볕같은 따뜻함이, 그 추운 에어컨 바람이 가득찬 흰색의 전시회장의 공기 틈을 비집고 조용히 배어나오고 있었다.
전부 반쪽으로 잘라진 물건들이 들어차있는 방 옆에 적혀있던 오노 요코의 얘기 "어떤 이들은 내가 그 전시에 반쪽짜리 사람을 넣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반쪽이다" 에서도,
이 작품에서도,
"주의
이 상자 안의 물건은 빛을 쏘이면 사라집니다"
- 오노 요코, 1971
그리고, 기억나는 또 기억나지 않는 다른 많은 작품들에서도, 웬지 사라지지 않을 슬픔 같은것이 배어있는, 조용한 따뜻함이 흐르고 있었다.
무슨 추상적 상징적 공감각적 이미지 같은게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감촉으로 말이다.
그건 말하자면,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의 유니콘 머리뼈에 남겨져있던 그 온기의 느낌과 가장 닮아있었다.
••
그리고, 전시의 마지막에 있던 '돌 무더기 쌓기'에 적혀있던 글귀에서, 나는 비로소 그 따뜻함의 실체가 무엇이었던가를 알 수 있었다.
일생동안 겪었던
슬픔에 번호를 붙여 목록을 작성해보라.
번호가 늘어날때마다 돌을 하나씩 쌓아보라.
슬프다고 생각할때마다,
돌을 하나씩 더 쌓으라.
목록을 불태우고
쌓인 돌의 아름다움을 평가해보라.일생동안 누렸던
행복에 번호를 붙여 목록을 작성해보라.
번호가 늘어날때마다 돌을 하나씩 쌓아보라.
행복하다고 느낄때마다
돌을 하나씩 더 쌓으라.
쌓인 돌을
슬픔의 돌과 비교해보라.
관객들이 직접 판자에 못을 박게 한 작품 앞에서, 못을 박으려면 5실링을 내라고 하는 오노 요코에게 "당신에게 상상의 5실링을 주고 상상의 못을 박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던 존 레논 역시 멋졌지만, 그런 존 레논이 없이도 그녀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멋진 여성이었다.
• •
뭔가에 대해, 얄팍한 지식만을 가지고 이제는 웬만큼 이해했다고 또는 이제 알만한 것은 다 알았다고 믿는 것은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오노 요코의 작품들을 보고 난 뒤, 나는 가끔씩 상상의 망치로 상상의 내 머리통을 때리곤 한다.
•